이번에는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수사의 객체_피의자의 개념, 지위 및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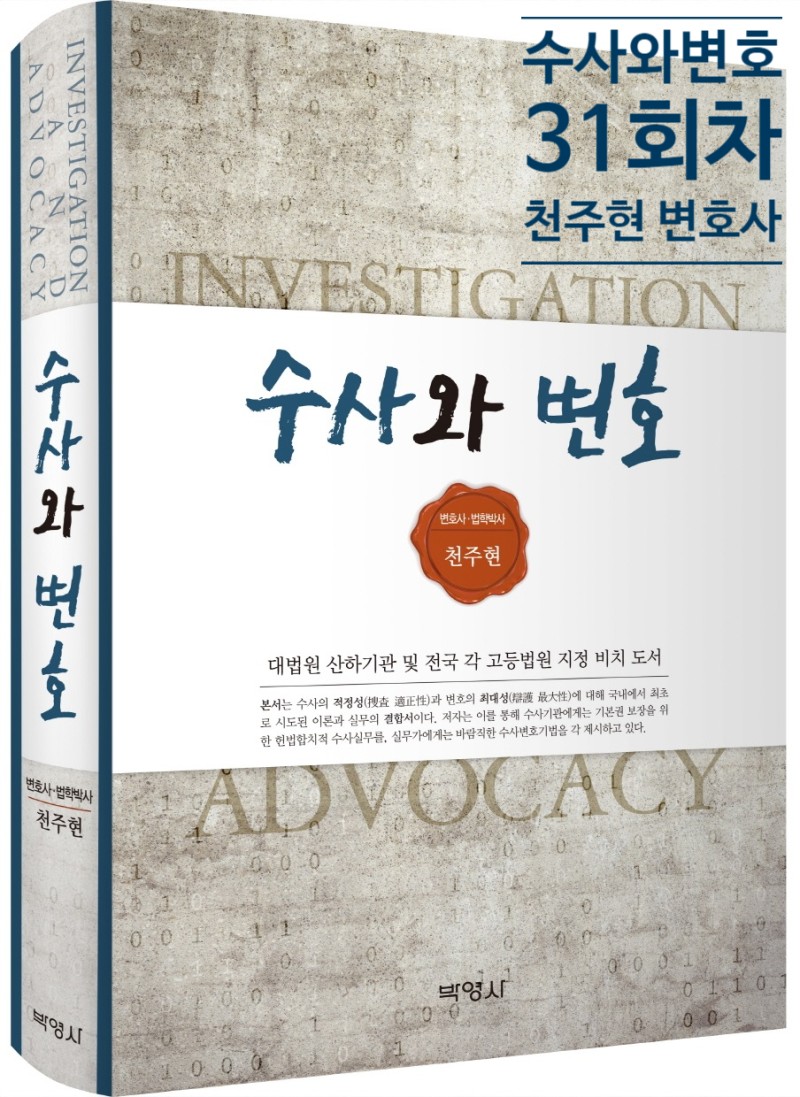
[수사와 변호 31회차]
‘수사의 객체’
‘수사와 변호’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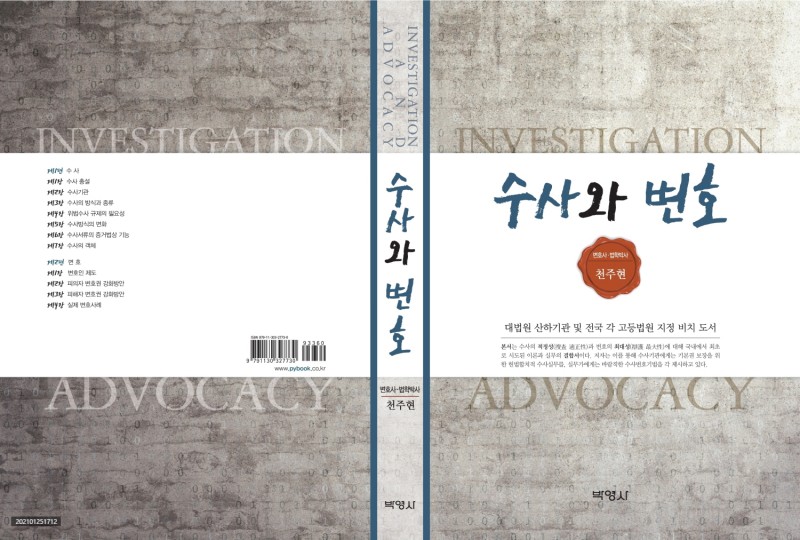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1절 피의자의 개념
피의자는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객체가 된 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않고, 수사기관은 우월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수형자가 되는 것과 구별된다.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被疑者)와 내사의 대상이 된 피내사자(被內査者)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절차법상 권리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수인이 같은 혐의로 수사 받는 경우 흔히 ‘공범’, ‘상피의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 수사기록상으로도 그와 같다. 실무상 ‘공동피의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는 않다. 공범 중 1인의 도주는 다른 공범의 구속사유가 되거나,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을 자백하지 않는 경우 역시 구속사유가 되는 등(증거인멸 우려) 수사절차에서 공범자 간에는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인다. 또 공범의 수사단계 진술은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상피의자가 내용인정을 할 경우 상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고(법 제312조 제3항),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한 공범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상피의자가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법 제312조 제4항).
제2절 피의자의 지위 및 권리
1. 수사절차상 지위
피의자는 수사절차상 수사의 객체가 된다.(각주 1)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은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고 형사절차의 실천원리이므로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었다. 무죄추정원리의 형사소송법상 구현모습으로는 인신구속의 제한, 충분한 증명(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 불이익처우의 금지를 들 수 있다.(각주 2)
2.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각종 권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절차로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2조 제1항), 원칙적 임의수사·예외적 강제수사를 받을 권리(법 제198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단서),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백(임의성이 없는 진술 포함)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2항, 법 제244조의 3), 무죄추정권(헌법 제27조 제4항),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권리(선임, 참여, 접견, 수수)를 가지며(법 제30조, 제34조, 제89조, 제90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참여권(법 제219조, 제121조, 제145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방어권, 영장심사·구속적부심사청구권(법 제201조의2, 헌법 제12조 제6항 및 법 제214조의2), 구속취소청구권(법 제209조, 제93조), 법정의 방식으로 조사받을 권리 및 조서열람·이의권(법 제244조), 구속·범죄사실 통지·고지권(헌법 제12조 제5항,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 제88조), 증거보전청구권(법 제184조), 압수물 가환부청구권(법 제133조),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1항)을 갖는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권리라 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올바르게 고지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자백편중과 고문이라는 불법한 수사관행이 통제될 수 없다. 또한 불리한 상태에 놓인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과 적법한 수사절차가 무엇인지 조언해 줄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다면 진술거부권의 올바른 행사는 불가능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이 기재된 조서가 향후의 불리한 증거로 남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과연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었는지, 스스로 원하여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받은 것인지, 문답 과정에서 회유·협박·고문은 없었는지,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은 맞는지, 피의자가 자의로 날인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따질 때는 이미 너무 늦다. 실제, 조서 작성과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뒤늦게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2가지 권리에 대해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여기에 있다.
가. 진술거부권(묵비권)
(1) 진술거부권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법원·검사 등의 신문 또는 진술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진술거부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각주 3)
그 연혁과 관련해서는, 중세 및 근세 초기의 규문절차에서는 자백강요를 위한 고문이 허용되었으므로 죄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자기부죄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은 17C 말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청교도에 대한 가혹한 강제신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보통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이를 계수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가 「No person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근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각주 4)
(2)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8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재판장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판단계(裁判段階) 진술거부권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다.
나아가 수사단계(搜査段階)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이익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할 경우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참여하에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244조의3 제1항). 1회 조사 후 2회 조사가 별도로 잡힌 경우라면 각 회 조사마다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각 회 신문 전에 항상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고,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3)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5)
따라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각주 6)
(4) 한편,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를 취할 때에만 진술거부권이 보장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여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각주 7)
(5) 그러나 진술 이외의 지문의 채취, 신체측정, 사진촬영 및 신체검사에까지 진술거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까지 의사표시로서의 진술로 보는 것은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처럼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할 뿐 생각,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각주 8) 미국 연방대법원도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채혈은 연방헌법 수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같은 입장이다.(각주 9)
(6)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구별설)(각주 10)와 임의성에 의심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비구별설, 일체설)(각주 11)가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구별설(區別說)을 취하고 있다.(각주 12)
생각건대, 이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우리 법에 명문화되었고, 위법하게 취득한 진술일 경우 곧바로 증거능력을 배제함이 마땅하지, 임의성이 있는지를 재차 살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구별설(區別說)이 타당하다.
(7)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보아야만 한다.(각주 13)
(8) 그렇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구속사유로 보는 것은 과도한가.
학설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否定說)(각주 14)와 별개의 문제(각주 15)이므로 얼마든지 구속사유(증거인멸 염려)로 봐도 좋다는 견해(肯定說)(각주 16)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진술거부 자체가 증거인멸의 개연성을 근거 짓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구속사유 또는 보석배제사유로 작용할 경우 진술거부권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9) 다음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이를 허용할 경우 진술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加重量刑 不許說),(각주 17) 현실적으로 자백하는 자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 보는 견해(加重量刑 許容說)(각주 18)의 대립이 있고,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태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例外的 加重量刑許容說, 折衷說).(각주 19)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라는 표현으로 형의 가중사유를 밝히고 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자백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를 같이 취급하기 어렵고, 부인의 방법으로 묵비를 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법원의 태도와 같이 예외적으로나마 가중양형의 조건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관들을 상대로 균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길일 줄로 본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법 제30조, 제33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법 제34조)이 있다.
(2) 변호인선임권(辯護人選任權) 보장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 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크게 확대된 점이다.
피고인(被告人)과 관련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추가되었고(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필요적 선정과 신청에 의한 선정 외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선정도 가능해졌으며(법 제33조 제3항), 피의자(被疑者)와 관련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법 제214조의2 제10항) 및 영장실질심사(법 제201조의2 제8항 내지 제9항)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붙일 수 있거나,(각주 20) 붙이도록 하였다.(각주 21)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전의 피의자는 여전히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의 확대와 관련해서 보면, 첫째,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부당한 간섭도 없어야 하며,(각주 22) 둘째,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방어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각주 23)에 의해 종전에는 불허되던 구속적부심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셋째, 수사과정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명문화(법 제243조의2)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입회를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법 제417조), 나아가 위법하게 획득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이다.(각주 24)
(4) 우리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이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변호인조력권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결정)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되지 않게끔 보장”(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진술강요나 고문 등 가혹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는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진술이 추후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사용될지 알지 못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도 충분한 도움은 필요 불가결하다.(각주 25)
피의자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이익(法的·事實的 利益)을 누리게 된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에 관한 피의자·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의논하며, 피의자나 피고인 진술의 방법, 정도, 시기, 내용 등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말하고 지도도 하고, 진술거부권이나 서명·날인 거부권의 중요성과 유효적절한 행사방법을 가르치고 그것들의 유효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억울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자백강요, 사술(詐術), 유도(誘導), 고문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가르쳐 허위자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유도, 협박, 이익공여, 폭력 등)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안, 절망, 고민, 허세 등을 발견하면 그 감정의 동요에 따라 격려하여 용기를 주거나 위문하거나 충고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결정).
(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하고도 적절할 것을 요하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방어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일체의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被疑者)·피고인(被告人)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접견에도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 피의자 간의 접견시 가시거리 내에서 지켜보는 것은 허용하나, 가청거리 내에서 감시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을 계호(戒護)함에 있어서도 1988. 12. 9. 제4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제18조 제4항이 "피구금자 또는 피수감자와 그의 변호인 사이의 대담은 법 집행 공무원의 가시거리(可視距離)내에서 행하여 질 수는 있으나 가청거리(可聽距離)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관계공무원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담내용을 들을 수 있거나 녹음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계호나 그 밖의 구실아래 대화 장면의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접견에 지장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여기서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자처우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접견 시간제한의 의미는 접견에 관한 일체의 시간적 제한이 금지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그 접견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인 때에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용자처우법 제8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341 결정).(각주 26)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각주 27)
(마) 미국 연방대법원도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부족한 조력행위가 존재하며 그러한 부족한 조력행위 없이 변호인이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robability)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각주 28)또한 구속 및 보석 여부 심사절차(article 15.17 hearing)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어 결국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당사자주의적 소송은 위의 구속 및 보석 여부 심사 절차에서부터 개시되며 따라서 위 절차에서 피고인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 근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여 여부는 검사가 해당 절차의 개시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 29)(각주 30)
< 각주 >
1) 실무상 사람이 객체로 등장하는 다른 예로는,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파탄의 사유와 재산증식의 사정을 조사하는 경우의 원·피고, 증인신문(證人訊問)에서 증인, 신체감정(身體鑑定)에서 원고, 정신감정(精神鑑定)에서 피고인이 각 절차의 객체가 된다. 수사의 객체든 가사조사의 객체든, 감정의 객체이건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체진실을 밝히지 못하는데도 출석치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든 민사절차든 소정의 직접강제 또는 간접강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형사소송의 증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의 과태료 및 감치처분이 가능하고, 감정의 경우 동법 제172조의2에 따라 감정유치가 가능하다). 수사의 객체인 피의자에게는 출석불응시 동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사유가 된다.
2)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15-117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추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을 인정해야 함은 더더욱 당연하다. 같은 책 117면.
3)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541면.
4)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541면.
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8)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9) Schmerber v. California 384 U.S 757, 1966 판결.
10)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19권 3호(통권 제7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2-93면;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543-544면{백형구 변호사는, 그 근거에 대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피의자신문절차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법 제308조의2)에 의해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82면.
1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341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4판, 21세기사, 2013, 104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23면, 125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3, 390-391면; 손동권/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84면. 손동권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나, 자백 아닌 진술의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제308조의2에 따라 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이 판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4판, 21세기사, 2013, 104면에서는, 이 판례가 구별설과 일체화설 가운데 어떤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지 자체도 논란거리로 보고 있다.
13) 同旨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25면.
14)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347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89-790면;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19권 3호(통권 제7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5-96면. 김용세 교수는, 구속사유(증거인멸 우려)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15) 진술거부의 사실과 증거연멸의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동규, 형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3, 392면).
16)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3, 392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25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4판, 21세기사, 2013, 105면. 차용석/최용성 교수는, 구속사유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것은 진술거부권의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나 보석의 합리성 판단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바로 증거인멸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다른 증거의 존부 등의 사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17)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347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제4판, 21세기사, 2013, 105면;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19권 3호(통권 제7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95-96면. 김용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백이 없더라도 유죄인정에 어려움이 없고(수사상 필요성 없음), 가사 유죄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유죄를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이상, 그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헌법적 형사소송관에 반함), 재판 당시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뒤늦게 무죄가 밝혀지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실제 피고인의 부인 또는 진술거부의 사유가 타당할 수 있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형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도 거듭 같은 질문을 하고 반복적으로 소환하거나 구속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진술을 종용하는 예가 흔히 있는데, 이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괄호 안의 내용으로 요약한 것은 필자가 임의로 정리한 것임.
18)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125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2013, 392면;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544-545면; 손동권/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3, 85면에서는 단순 부작위에 그치는 한에서는 부정설을 취하나, 적극적 허위 진술의 경우에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진술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19)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신동운 교수는 판례가 취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법 제29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양형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의 진술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거조사의 선행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이 확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기 위한 피고인의 거짓진술이나 개별적인 진술거부는 불리한 양형사실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운 교수는 종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양형사유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정하였으나,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89면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절충설을 취하게 되었다.
20) 체포적부심의 경우(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21) 구속적부심의 경우(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영장실질심사의 경우(201조의2 제8항).
2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부당하게 금지된 상태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4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23)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24) 김용세,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적 형사소송의 원리에 기초한 분석적 고찰”, 「형사정책연구」19권 3호(통권 제7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88-91면 참조.
25) 법률신문, 기사, “미결수용자 변호인의 공휴일 접견불허 결정에 대한 검토”, 2012. 10. 8.자 참조.
26)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을 접견하려 한 것이 6. 6. 현충일로 공휴일이라 접견 불허되었고, 이틀 후 접견이 실시되었으며, 기록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었던 사안.
참고로 이 결정의 보충의견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접견을 금지하는 교정행정의 관행은 일본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협의 내용(미결수용자가 해당 시설에 수용된 후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접견은 공휴일이라도 무조건 허용)을 참조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7) 물론 열람·등사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28) Stickland v. Washington, 466 U. S. 668(1984) 판결.
29) Rothgery v. Gillespie County, 564 U. S. 191(2008) 판결.
30) 박용철, “미국의 형사법 연구의 쟁점과 동향-2007년~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14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221-230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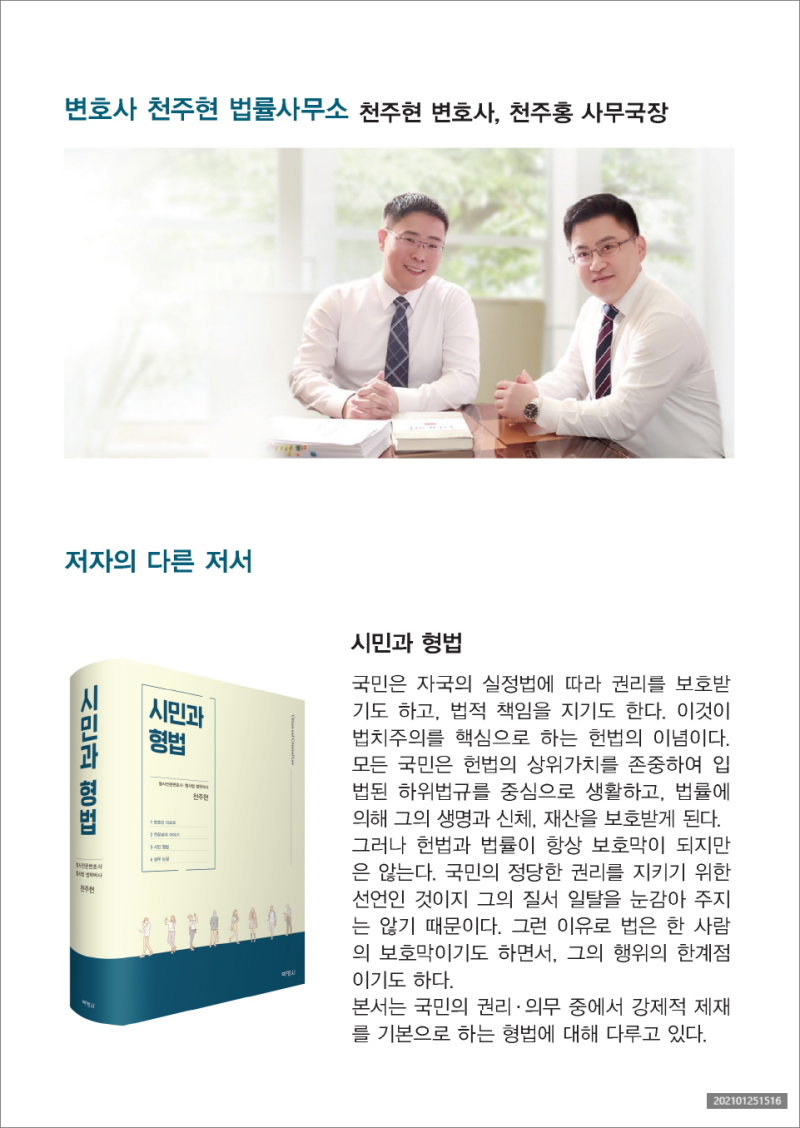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수사의 객체_피의자의 개념, 지위 및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대구형사사건전문 #대구형사사건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수사의객체 #피의자 #대구피의자 #피의자의지위 #피의자의권리 #대구경찰피의자 #대구검찰피의자 #대구피의자변호사 #대구경찰피의자변호사 #대구검찰피의자변호사 #대구변호인 #대구피의자변호인 #대구경찰피의자변호인 #대구검찰피의자변호인 #대구피의자변호 #진술거부권 #묵비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변호인조력 #대구수사변호사 #대구수사변호인 #대구형사재판 #대구형사재판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