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67회차]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67]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허위고소로 처벌을 구했지만, 무고죄를 비껴간 무죄 사건이 화제다. A는 마약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의 가족들이 사는 곳은 원주여서 A도 가족도 모두 면회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A는 누나 B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부탁했고, 남매는 무고죄 재판의 공동피고인이 되고 말았다. A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B에게 부탁했다고 하니, 짜고 한 고소가 맞다. 고소내용은 A가 빌려간 돈을 떼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B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반려됐고, 법을 잘 모르던 B는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권이 없는 법원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허위고소로 판단해 A를 무고교사, B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허위로 판명 난 고소는 검찰 주장처럼 무고가 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고, 형사처분과 관련한 공무소는 수사관서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노동청이 대상기관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허위고소장을 접수해도 무고죄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1심도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점에 주목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B가 일단 경찰관에게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중시해 무고는 기수에 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주지청에 정식접수된 때에 허위사실 신고가 있다고 봤지만, 내용적으로 무고사실을 담고 있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다. 이 점에서 위증죄가 자신의 기억에 반해 증언할 때 처벌되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설사 고소인이 기억에 반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벌할 수 없다(대법원 91도1950 판결). 한편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여야 본죄가 되고, 일부 내용이 사실에 반해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데 불과하거나 범죄성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못 되면 무죄가 된다(대법원 96도771 판결). 그리고 법적 평가,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가 아니란 점도 중요하다(대법원 84도1737 판결).
주의할 것은, 신고사실이 허위지만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아 조사가 필요없음이 명백하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대법원 2006도558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한 때(대법원 84도2919 판결), 사면된 것이 분명한 때(대법원 69도2330 판결),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가 분명한 때(대법원 98도150 판결)가 대표적 예다. 터무니없는 허위고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다. A와 B는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이고, 친족이다. 이러한 비동거친족 간에는 본건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고소기간은 6개월이다. 그런데 B가 속아 A에게 돈을 꿔줬더라도 범죄피해를 알고도 3년 2개월이 지나 고소했으므로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B 무고 무죄, A 동 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대법원 2018도1818 판결). 그러나 만약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고소했다면 A, B는 처벌됐을 것이다(대법원 95도1908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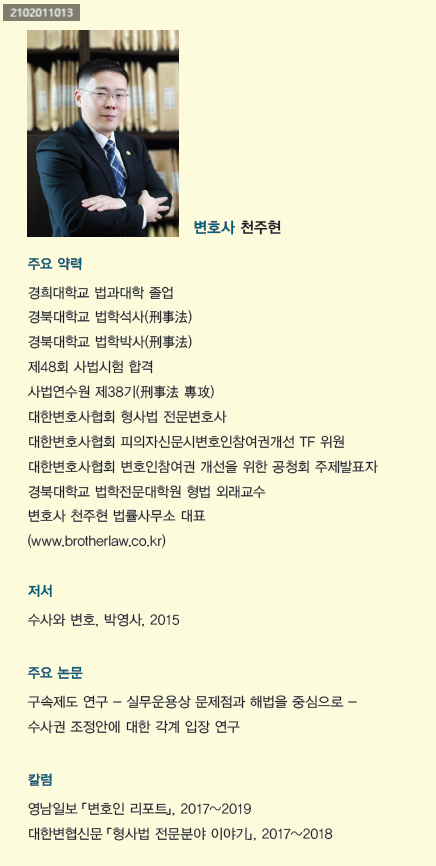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마약죄, 허위신고, 형사고소, 형사범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